이창용 "대규모 재정적자가 미 국채금리 상승 요인"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마치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연 5%대로 가고 있는 문제가 최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도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며 "금리 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두가지 견해나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미국의 긴축 장기화 기대가 강해졌다는 설명이다. '고금리 장기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미국 중앙은행(Fed)에 대해 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다가 개선된 경제지표가 나오자 이제야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채권 수요가 줄면서 금리가 올랐다는 해석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도 지적됐다. 이 총재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6%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복지 축소 등 합의가 없다"며 "(적자 충당을 위해) 장기채권을 더 발행해야하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문제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번째 해석이 더 많은 동의를 얻었다"고 했다.
하마스 사태와 관련한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하마스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다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재정지원을 언급하자 적자 우려가 커지며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한국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를 따라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변동환율제가 운영되는 국가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통화정책은 독립적이 된다는 게 교과서적 설명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환율이 변동하는데도 중장기 금리가 동조화되고 있다"며 "IMF와 국제결제은행(BIS) 전문가와 이야기해도 마땅한 답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한은 총재 "기준금리 동결, 금통위원 전원 일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ZN.34828408.3.jpg)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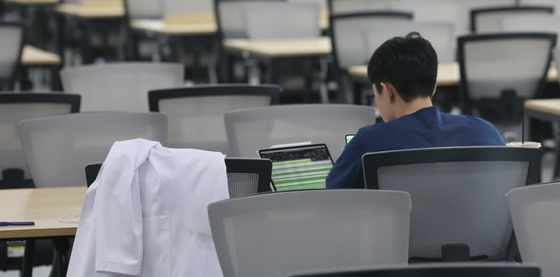


![[이 아침의 문인] 빈민가 출신 소설가 겸 시인…찰스 부코스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09902.3.jpg)